유아용품에서 발암물질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 심심치 않게 들으셨죠.
이번에는 우리 일상에 훨씬 더 널리, 또 깊이 스며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이들 물건을 불에 덜 타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난연제' 얘긴데요.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서현아 기자, 난연제, 그러니까 연소를 억제하는 화학물질인데
유아용품에 많이 쓰이고 있나 보죠?
서현아 기자
보통은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씁니다.
겉 천이 씌워진 가구, 예를 들면 소파나 기저귀 갈이대라든지요,
이불이나 카시트 등이 대표적인데요.
난연제라고 다 위험한 건 아니지만 염소나 브롬 같은 유해물질을 많이 쓰는 게 문젭니다.
예를 들어, 브롬계 난연제는 암을 유발하거나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들 발달에도 치명적이어서, 과잉행동이나 IQ 손실,
지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최근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유아용품과 난연제의 관계를 10년 넘게 추적한 미국의 한 연구진이 최근
또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했다면서요.
서현아 기자
미국 듀크대 헤더 스테이플턴 교수 얘긴데요.
2011년에 폴리우레탄폼 소재를 사용한 유아용품 85%에서
유해 난연제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최근 또 새로운 연구를 했는데, 뉴욕타임즈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헤더 교수는 당시 한살짜리 아들이 쓰던 유아용 텐트에 난연제가 쓰인 걸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 조각을 분석했더니, 발암물질이 나온 거죠.
충격을 받아서 수유 쿠션이나 매트, 식탁 의자, 카시트처럼 비슷한 소재 제품들을
조사해봤는데, 대부분 난연제가 쓰였고, 이들 제품서 유해물질도 검출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반론에도 부딪쳤는데요.
이들 소재 외부에 차단막이 있어서 유아들 몸에 유해물질이
흡수될 가능성이 적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아기들 소변에서 엄마보다 15배 정도
난연제가 더 많이 검출되었고요,
집에 아기용품이 많은 가정일수록 검출 빈도도 높았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런 물건 위에서 하루종일 뒹굴 뿐 아니라,
손발을 입으로 자주 가져가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유해물질을 흡수할 가능성이
컸던 것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현아 기자
연구진에 따르면, 역설적이지만, 아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물건을 많이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은 일단 성분표시만 봐선 난연제가 들어있는지, 알아내기 어렵고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제품에 난연제가 첨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예 안 살 수는 없으니까요.
주요 유아용품의 유해물질 여부를 모니터링해서 알려주는 웹사이트라든지,
소비자 보호 단체의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겠고요.
아이들 손발을 자주 닦아주고, 항상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아이들 건강 관련한 또 다른 소식 살펴보죠.
코로나 상황에서 실내 운동,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그나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요령이 있다고요.
서현아 기자
미국에선 학창시절 과업으로 공부 못지않게 운동을 중요하게 여기죠.
역시 뉴욕타임즈 보도인데요.
사회활동을 최대한 안 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는 좋지만,
최소한의 운동을 이어가고 싶은 가정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했습니다.
일단 마스크가 좀 달라야 합니다.
적당히 신축성이 있고, 방수가 잘 되면서, 무엇보다 여러 겹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운동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습기를 내뿜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스크가 젖으면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떨어지니까,
여러 장을 준비해서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장비를 공유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특히 수건이나 물병, 꼭 혼자 써야겠죠.
부득이하게 간식을 먹어야 한다면, 낱개 포장된 에너지바 정도를
일행과 떨어져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손 소독제와 거리 두기 언제나 중요하고요.
팀을 이뤄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일정 동작을 반복하는 정도의
운동을 가볍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R&D 예산 삭감 후폭풍 여전…차기 정부 과제는? [조기 대선, 교육의 미래를 묻는다] / EBS뉴스 2025. 04. 22](https://ricktube.ru/thumbnail/rjZgJwlU0ic/mqdefaul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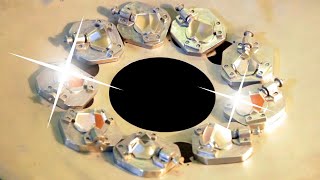
![장애의 벽을 넘어…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되려면? [교사의 눈] / EBS뉴스 2025. 04. 18](https://ricktube.ru/thumbnail/PKyZdJKMQIo/mqdefault.jpg)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