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의’에 대한 영화 제작진의 설명 유감]
(1) ‘방법: 재차의’ 영화 제작진은 ‘재차의(在此矣)’를 ‘여기 있다’란 의미의 한자어로 ‘용재총화’에 나오는 되살아난 시체를 뜻하며 일종의 좀비나 강시와 비슷한 한국 전통 요괴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설명이 아니다.
‘재차의(在此矣)’란 문구가 ‘용재총화’에는 나오지만 ‘되살아난 시체’나 ‘한국 전통 요괴’를 가리킨다는 것은 용재총화의 원래 의미에 없는 내용으로 아마도 용재총화에 나오는 한종유가 되살아난 시신 흉내 낸 이야기에 기반하여 현대에 각색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용어이다. 다음 2000년대 몇몇 블로그 등에 나오는 ‘재차의’란 용어는 모두 ‘용재총화’에 근거한 것처럼 가짜로 꾸며서 만든 이야기에서 나온 것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창작된 말과 이야기이다.
(2) 영화 제작진은 혹시 ‘재차의’라는 한국형 요괴가 조선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는 이렇게 설명해야 한다.
[‘재차의(在此矣)’는 ‘여기 있다’란 의미의 한문 문구로 조선시대 ‘용재총화’에 나오는 말인데, 현대에 가상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되살아난 시체, 한국 전통 요괴’라는 설정으로 표현한 말이다.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해 마치 조선시대 자료에 근거한 이야기인 것처럼 가상으로 꾸며서 영화 이야기 속에 담은 것이다.]
----------
『용재총화(慵齋叢話)』는 조전 전기 성종대의 성현(成俔, 1439~1504)이 고려로부터 조선 성종대에 이르기까지의 민간 풍속·문물 제도·문화·역사·지리 등 문화 전반을 다룬 잡록이다.
----------
慵齋叢話_卷3
高麗政丞韓宗愈, 少時放蕩不羈, 結徒數十人, 每於巫覡歌舞之處, 刼掠醉飽, 拍手歌楊花, 時人謂之楊花徒. 公嘗漆兩手, 乘夜投入人家殯室, 其家婦人來哭殯前曰: “君乎君乎! 何處去乎?” 公以黑手出帳間, 細聲答曰: “我在此矣.” 婦人皆驚懼而遯, 公盡取所設床果而還, 其狂多類此. 及爲相國, 功名事業, 彪炳當世, 晩年退老鄕曲, 即今漢江上樗子島也. 嘗作詩云: ‘十里平湖細雨過, 一聲長笛隔蘆花. 却將殷鼎調羹手, 還把漁竿下晩沙.’ 又云: ‘烏紗短褐遶池塘, 柳岸微風酒面凉. 緩步歸來山月上, 杖頭猶襲藕花香.’
고려 때 정승 한종유(1287∼1354)는 어려서 자유분방하여 아무데도 메이지 않는 성격이었다. 수십 명과 무리를 짜고 언제나 무당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데에 가서 음식을 빼앗아 취하도록 포식하고는 손벽을 치며 양화(楊花) 노래를 부르니, 그때 사람들이 양화도(楊花徒)라고 불렀다. 일찍이 공은 양손에 칠을 하고 밤에 남의 집 빈소(殯所)로 들어갔다. 그 집 부인이 빈전(殯前)에 와서 곡을 하는데, “서방님, 서방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자, 공이 장막 사이로 검은 손을 내밀며 가는 소리로, “나 여기 있소.” 하니, 부인은 놀랍고 무서워 달아나고, 공은 제상(祭床)에 차려놓은 과일을 모두 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미친 행동이 많았다. 상국(相國)이 되어 공명과 사업이 당세에 빛나고, 만년에는 물러나 고향에서 노년을 보냈는데 지금의 한강 상류의 저자도(樗子島)이다. 일찍이 시를 짓기를,
10리 평호에 보슬비 지나고 / 十里平湖細雨過
한 줄기 긴 피리소리 갈대꽃 너머로 들린다 / 一聲長笛隔蘆花
은나라 솥에 국 요리하던 손을 가지고 / 却將殷鼎調羹手
한가로이 낚싯대 잡고 해 저문 모래밭을 내려간다 / 閑把漁竿下晩沙
하고, 또
검은 사모에 짧은 갈옷으로 지당을 돌아서니 / 烏紗短褐遶池塘
버드나무 언덕 시원한 미풍이 얼굴에 스친다 / 柳岸微風酒面凉
천천히 걸어 돌아오니 산 위엔 달이 떴고 / 緩步歸來山月上
장두에선 아직도 연꽃 향기 스며온다 / 杖頭猶襲藕花香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번역]
[영상 출처]
▲ 재차의'군단의 습격! [방법: 재차의] 메인 예고편 (1분19초)
• '재차의'군단의 습격! [방법: 재차의] 메인 예고편
▲ [방법: 재차의] 제작보고회 하이라이트 1탄 (1분40초)
https://www.facebook.com/watch/?re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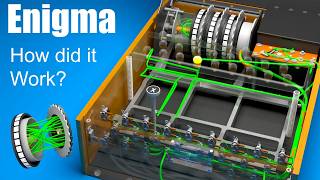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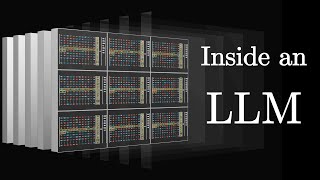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